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희망 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 퇴직. 말이 희망이지, 사실상 정리해고나 다름없다. 직장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상호 합의에 따라 정년 전에 퇴직 절차를 밟는 것이지만, 은연중에 자발적 퇴직을 권하는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 희망 퇴직의 칼바람을 견뎌낸 직장인이 있다. 그야말로 이 악물고 버틴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한 트위터 계정에서는 누리꾼 A씨가 소개한 “희망 퇴직을 버틴 직장인” 사연이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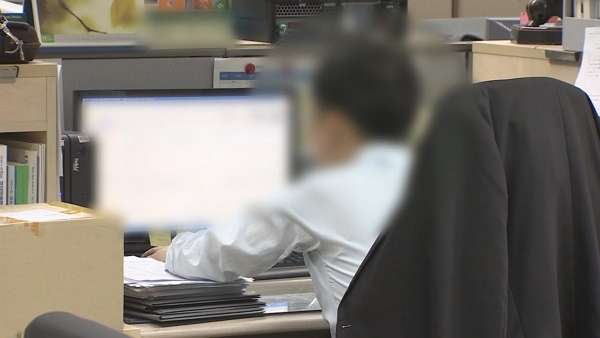
그는 “모사에서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눈치껏 사직서를 냈다. 그런데 딱 한 분만 끝까지 남았다. 그분은 ‘이 회사가 좋고, 오래 다니고 싶다’고 말했단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금요일에 다른 분들이 다 퇴사하고, 남은 한 분은 회사에 남아 그들을 배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리고 월요일이 됐다. 그분은 소속 팀이 사라져서 다른 팀으로 배치를 받았다. 구석자리였다. 책상 위에는 회사 창업주의 자서전과 업무일지, 볼펜만 있었다. 컴퓨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1. 8시간 동안 업무에 집중할 것.
2. 스마트폰 사용 금지.
3. 화장실 이용 시에도 업무일지에 기입.
4. 15분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
5. 주어진 업무가 없다면 자서전 탐독.
6. 업무 배정까지 무기한 대기.

A씨는 “당연히 업무 배정은 없었다. 마치 문이 열려 있는 교도소 독방 같은 회사 생활이었다. 아무도 그분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 자서전만 읽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게 6개월을 버텼다고 한다. 회사 인사팀도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 결국 그분은 다른 팀에 재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난 이 이야기를 인사팀 직원에게 들었다. 듣는 동안 술에서 아무 맛도 안 느껴졌다”고 남겼다.
